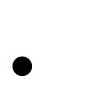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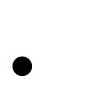
모텔 몬티첼로의 간판인 거대한 치펀데일 하이보이 모양의 실루엣은 모텔이 나타나기 전부터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의 건축과 간판은 반 공간적이다. 공간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우위에 두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 공간을 압도하고 건축과 풍경의 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는 풍경의 새로운 스케일을 위한 것이다. (…)
30년 전의 운전자는 공간 속에서 방향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원문은 72년에 쓰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30년전은 40년대를 의미하는듯) 단순한 교차로에는 화살표가 그려진 작은 표지판까지 서서 이미 명백한 방향을 다시 확인시켰다. 누구든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교차로가 클로버 잎 모양으로 바뀌자 좌회전 하려면 일단 우회전 해야 했다. 이 모순적 상황은 앨런 다칸젤로의 작품에서 통렬하게 드러난다. 운전자가 그 위험한 곡선 미로의 역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 따위는 없다. 운전자는 표지(signs)에 의존해 길을 잡는다. 고속으로 통과하는 드넓은 공간에 서 있는 거대한 표시에.
보행자 스케일에서 상징이 공간을 압도하는 현상은 거대한 공항에서 나타난다. 근 기차역에서의 동선은 택시에서 내려서부터 매표창구, 상점, 대합실, 플랫폼을 지나 객차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표지판이 없는 단순한 선형체계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건축가들은 “평면이 분명하다면 누구나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건물에 표지판을 반대한다. 하지만 복합적인 프로그램과 환경이라면 공간 속의 구조, 형태, 빛이라는 순수 건축의 세 요소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매체의 혼합이 필요해진다. 은근한 표현보다는 뚜렷한 소통의 건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