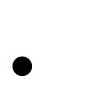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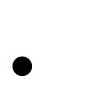
오선보의 체계가 무너지고 그래픽적 요소들이 지면에 등장하자 “쇼팽의 곡을 쇼팽의 곡으로 만드는 본질적인 음구조”가 사라졌고, 무엇이 이 작품을 이 작품으로 만드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그래픽적 기보법을 사용해 이전처럼 음 구조를 기록하거나 연주자가 내야 할 소리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도 가능해졌지만, 그래픽 악보는 그 속성상 불확정적, 우연성, 혹은 알레아토리 음악이라 불린 사례들과 깊게 결탁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악보가 대체 어떤 소리를 낼지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없었다. 이 작품의 모든 연주가 공유하는 지점이 있을지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연주를 듣고 이게 무슨 작품인지 역으로 추측하는 일도 몹시 어져워졌다. 청음이야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연주의 결과였다. 그래픽 기보로 쓰인 불확정적 음악에서 어떤 작품을 바로 그 작품으로 만들어 주는 요인이 악보에서 사라지자 악보와 연주의 관계는 순식간에 훨씬 느슨해졌다. 동시에 정확히 무엇을 작품이라고 불러야 할 지 모호해졌다. 연주자의 선택과 상상력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소리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주자가 만든 음악은 여전히 ‘그 작품에 대한 연주’로 여겨졌다. 사실상 즉흥에 가까운 연주를 들려주게 되더라도 유럽 전통이 뿌리내린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펼쳐 내는 사건은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으로 명명되었다. 작곡가는 어떤 연주자가 만들어 낸 소리를 예측할 수 없었고 그 선택에 관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의 저자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 음악 작품의 저자이긴 하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 오히려 작품의 저자가 되는 일이 더 손쉬워지기도 했다. 기호들을 일별해 놓고 그것을 ‘악보’라고 칭한다면 작곡가는 그 소리나 연주에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작품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을 연주자가 사후적으로 수행한다는 구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래픽 기보는 ‘작품’이라는 개념을 세차게 흔들었지만 음악의 생산 구조만큼은 고스란히 유지됐고, 표현 방식만 바뀐 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