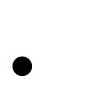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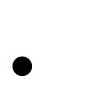
만화든 완구든 그 자체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품들을 그 부분으로 갖는 ‘커다란 이야기’ 혹은 질서가 상품의 배후에 존재함으로써 개별 상품이 비로소 가치를 가지고 소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비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신들이 ‘커다란 이야기’의 전체상에 가까워진다고 소비자가 믿게 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무수한 상품(<빗쿠리만> 스티커의 경우는 772장)이 팔리게 된다. <기동전사 건담> <세인트 세이야> <실바니아 패밀리> <오냥코 클럽> 같은 상품은 모두 이 메커니즘에 따라 배후에 ‘커다란 이야기’ 혹은 질서를 마련해두고 이것을 소비자가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물건’을 파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관심이 특정한 마니아에 한정되어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완구 같은 한정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소비자의 공통감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소비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국면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되고 있는 것은 하나하나의 ‘드라마’나 ‘물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감추어져 있을 시스템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커다란 이야기) 자체를 팔 수는 없으므로 그 한 단면인 한 회분의 드라마나 한 단편으로서의 ‘물건’을 겉보기로 소비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나는 ‘이야기 소비’ 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품은 극히 위험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 소비자가 ‘작은 이야기’의 소비를 계속한 끝에 ‘커다란 이야기’ 즉 프로그램 전체를 손에 넣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작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인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수퍼 제우스’로 시작하는 772장의 빗쿠리만 스티커 중 한 장을 그대로 복사한 스티커를 만든다면 이것은 범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티커는 ‘가짜’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얼마든지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빗쿠리만’의 ‘세계관’에 따라 이것과 정합성을 가지면서 772장의 스티커에 그려져 있지 않은 773명째의 캐릭터를 만들어내어 이것을 스티커로 판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772장의 오리지널 중 어느 것도 복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가짜’가 아니다. 더구나 773장째의 스티커로서 772장과의 정합성을 갖고 있는 셈이니 오리지널인 772장과도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야기 소비’의 위상에서는 이와 같은 개별 상품의 ‘진짜’ ‘가짜’의 구별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이다.